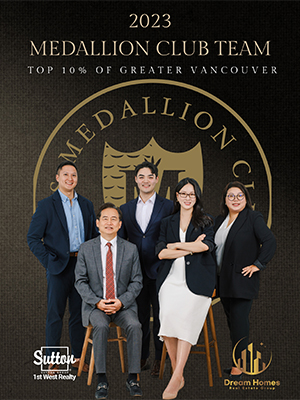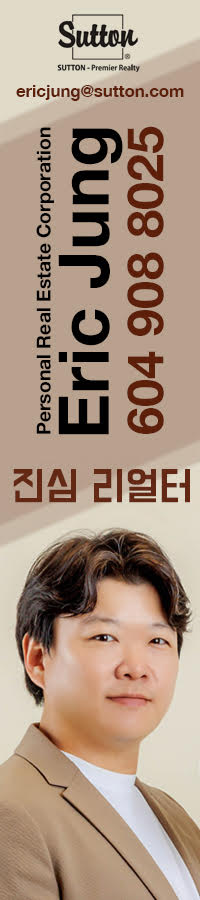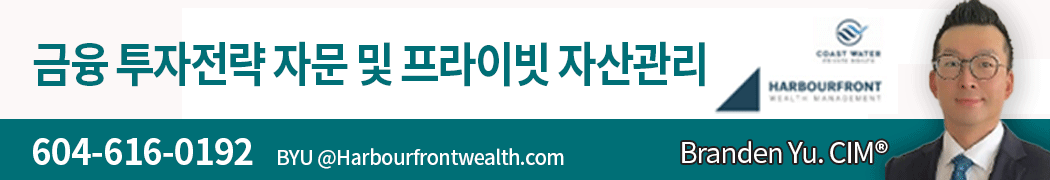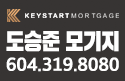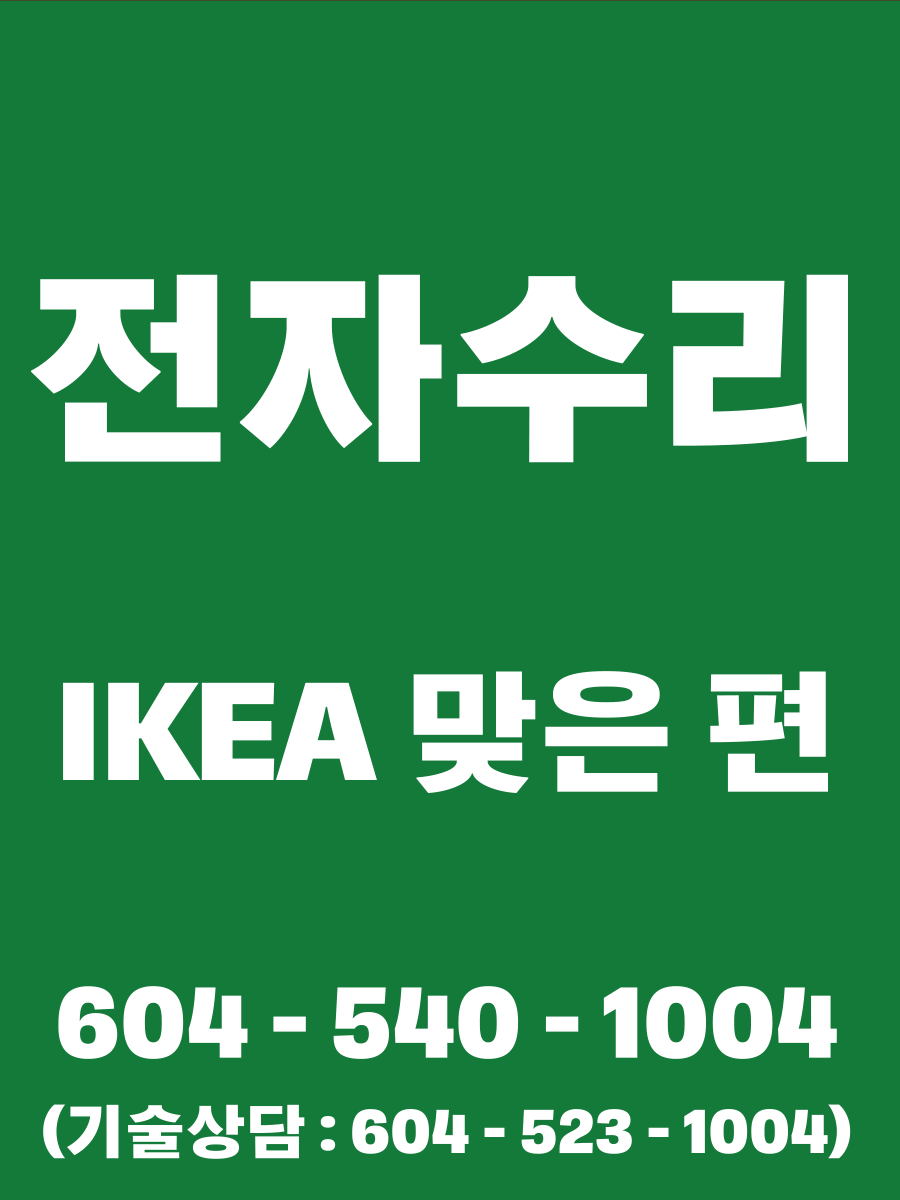하늘을 쬐며 흐르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다. 둑 아래로 걸으며 올려다 보는 하늘은 빌딩들 사이로 좁기만 하다. 하지만 발 옆으로 소리 내며 흐르는 청계천이 하늘 아쉬운 걸 잊게 한다. 한갓지게 물만 보며 한참을 걷는다. 살짝 이는 현기증마저 상쾌하다.
하늘을 쬐며 흐르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다. 둑 아래로 걸으며 올려다 보는 하늘은 빌딩들 사이로 좁기만 하다. 하지만 발 옆으로 소리 내며 흐르는 청계천이 하늘 아쉬운 걸 잊게 한다. 한갓지게 물만 보며 한참을 걷는다. 살짝 이는 현기증마저 상쾌하다.
청계천은 북악, 인왕, 남산 등에서 흘러내린 작은 물길들이 모여 서울 한복판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른다. 이젠 국제적으로도 서울의 대표하는 하천으로 명성을 떨치는 한강도 사실 풍수상으로는 객수(客水)다. 애초에 사대문 안을 관통하는 청계천을 서울의 내당수(內堂水)이자 명당수(明堂水)로 여겼다.
풍수지리의 외적 개념은 지형이나 물길 등 자연환경의 세(勢)를 살펴 길흉화복(吉凶禍福)을 따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의 핵심은 자연에서 생기(生氣)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풍(藏風)과 득수(得水)가 필수적이다. 즉 바람을 담고, 물을 얻는 요건을 따지는 탓에 이를 풍수(風水)라 했다.
이러한 표면적 개념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내면적 풍수의 개념에 다가가면 자연에 순응하고, 환경을 보호하려 했던 오래된 마음씨가 보인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일종의 환경운동이다. 환경운동으로서의 풍수, 생활풍수의 흔적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로부터 산 사람들이 사는 집(陽宅)만큼이나 중요시 했던 것이 죽은 사람들이 지내는 집, 곧 묘(陰宅)다. 묘의 자리는 보통 죽은 이가 생전에 지내던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뒷산에 잡았는데, 풍수상 터의 으뜸으로 꼽는 배산임수(背山臨水)에 입각해서 배산(背山)을 죽은 사람들의 공간으로 보장했던 것이다.
이는 물론 조상의 묘를 잘 써서 후손들에게 길이 발복을 기원했던 풍수의 정형적 정서에 입각했던 거지만, 한편으론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죽은 사람들의 공간을 설정하여,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려 했던 산 사람들의 마음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생활 속에 파고든 환경보호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풍수다.
십 수년 전 강남의 압구정동은 과소비와 환락, 또 저급한 유흥문화의 온상지로 지목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조선 초 한명회(韓明澮)가 이곳에 정자를 지어 압구정(狎鷗亭) 이라 한데서 동명(洞名)이 유래한 것처럼 아주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던 곳이었는데, 그만 타락의 오명을 뒤집어쓴 것이다. 당시 어느 풍수학자가 압구정동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한강의 압구정 건너편 옥수(玉水)로 흘러나오는 물을 정화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설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서울 지하철3호선 옥수역이 있는 곳이 청계천과 중랑천이 합류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점인 옥수다. 이곳 역시 말 그대로 물이 아주 맑고 경치가 뛰어나 제안대군이 세운 유하정(流霞亭)을 비롯한 많은 정자들이 자리했던 곳이다.
옥수의 정화(淨化)를 주장했던 이 풍수학자의 말은 당시 오염이 무척 심각했던 청계천과 중랑천을 되살리는 노력, 말하자면 환경을 보호, 보존하고 이를 후세들에게 고이 넘겨주려는 선한 마음씨들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때, 우리의 생활은 값지고 윤택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압구정 또한 타락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풍수를 자연을 보호하는 사회운동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다.
아닌 게 아니라 청계천과 중랑천이 되살아 맑아지고, 물고기와 새들이 다시 찾는 요즈음에 들어서는 더 이상 압구정동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랫동안 청계천(淸溪川)엔 천(川)이 없었다. 두터운 콘크리트를 뒤집어쓴 채 어둠 속에서 악취를 풍기던 청계천,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청계천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 청계천을 되살리는 때와 마찬가지로 청계천을 덮어 길을 내고 그 위에 하늘을 가리는 고가도로까지 내던 때에도 그 이유는 똑같이 좀 더 나은 우리의 삶(生氣獲得)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다시 물길을 드러낸 지금에 이르러, 그 시절의 청계천을 욕된 것으로 기록할지 모른다. 그러나 욕되고 아픈 시간마저도 끝내 우리가 보듬어야 할 우리 삶의 궤적임을….
*필자 김기승은 1979년부터 극단76극장, 극단 실험극장, 환 퍼포먼스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오기 직전 PMC 프로덕션 등을 중심으로 공연계에서 활동했고 연극, 뮤지컬, 영화, 콘서트, 라디오 등 100여 편의 작품들에서 연기, 연출, 극작, 기획 등을 맡아왔습니다. 제목 '추조람경'(秋朝覽鏡)은 당(唐)나라 설직(薛稷)이 쓴 시의 제목으로, 제자(題字)는 필자가 직접 썼습니다. <편집자주>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