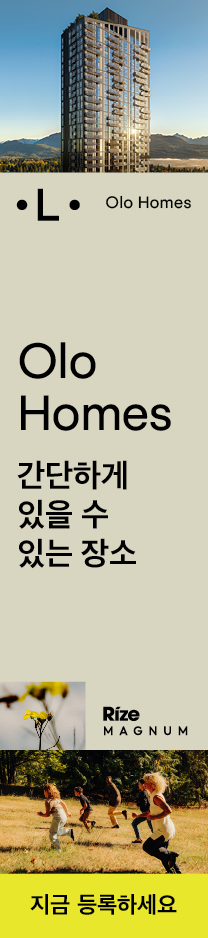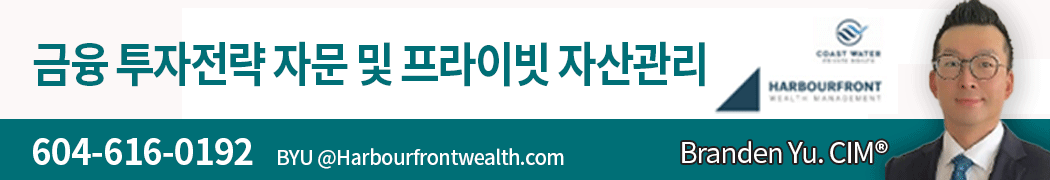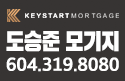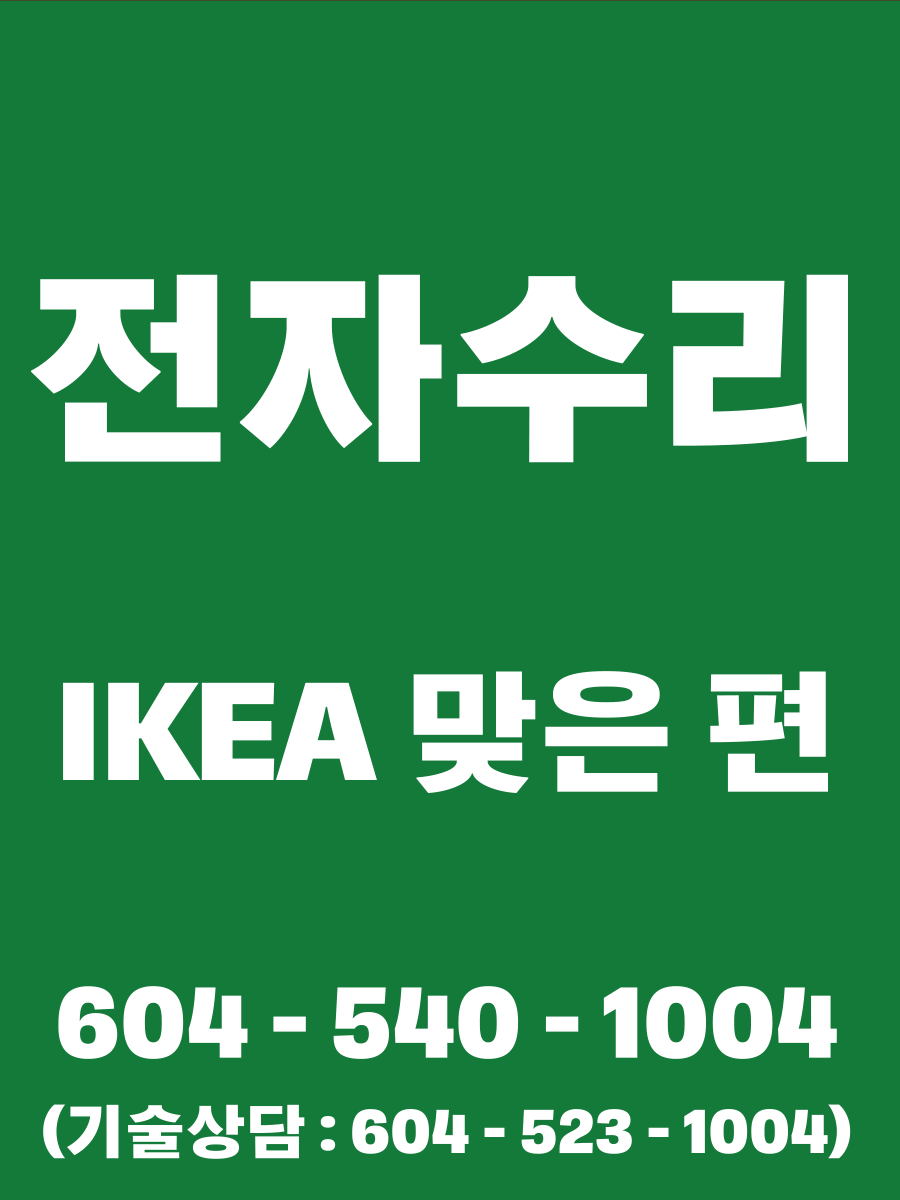신상희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것이다.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자신이 한국 사람임을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들. 그리고 그것이 불쾌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이었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들… 나는 도자기를 배우면서 때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일 년이 지났다. 돌이켜 보면 옛날의 나는 우리 도자기라는 것이 너무 익숙하여 식상함마저 갖고 있었다. 학창 시절, 국사책과 미술책에서 보았던 도자기 사진들하며, 박물관이나 민속촌에 전시되어 있는 많은 전통 도자기들. 하다 못해 어느 한식집엘 가더라도 짝퉁일망정 도자기 그릇이 음식을 담고 있지 않았는가. 익숙한 것엔 신비감을 느끼지 못하는 터라 한국에 살 땐, 우리 도자기라 하는 것들은 내 관심 영역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런데 이역만리에서 처음 우리 도자기를 보았을 때, 그 느낌은 참으로 반갑고도 정겨운 어떤 것이었다. 잊은 줄도 모른 채 잊고 있던 것을 우연찮게 찾았을 때의 느낌과도 같다고 할까…. 그렇게 도자기를 배우게 되면서 나는 도자기에 대한 내 지식의 수준이라는 게 참으로 알량하고 얄팍했었음도 깨닫게 됐다. 익숙하여 잘 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리고 우리 것이기에 잘 안다고 자신했었지만, 그저 ‘고려 시대는 청자요, 조선 시대는 분청, 백자’라는 학력고사용 단편적 사실 밖에는 아는 게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무지한 나 자신이 한국적인 모양새, 한국적인 곡선을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어 놀랍기도 했다. 단순한 물잔 하나에도 그것이 갖고 있는 고유한 곡선이 있어, 근소한 차이로 어떤 것에선 중국 냄새가 나고 어떤 것에선 서양 냄새를 풍김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디 나뿐이겠는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국적인 곡선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서양식이나 중국식처럼 화려히 펼쳐 있지 않고 수줍은 듯 오므라져 있다. 피기 직전의 꽃 봉오리 같은 모양이랄까, 아낙네가 치마를 여며 입은 자태라고 할까. 열어 보여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품고 있는 은은한 곡선을 한국 사람이라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도자기를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내 도자기 안에 그런 선이 담겨 있기를 소망하였다.
아쉽게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레 위의 흙을 부려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말랑말랑한 흙이 물레의 원심력을 따라 돌아갈 때 그것은 마치 의지의 화신인 양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손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한 번 잡힌 흙의 형태는 쉽게 변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은 다스리고자 흙에 힘을 가하고, 물레 위의 흙은 그 힘을 거부한다.
그러나 아주 가끔 물레 위의 흙과 나의 손이 하나가 된 듯한 순간이 있다. 나와 흙이 평화를 이루어 내가 흙을 억압할 필요도 없으며 흙이 나의 손을 기꺼이 받아 들이는 순간이다. 주위 모든 것들의 색이 바래지고 소리가 없어지며 그저 물레와 나 자신만이 또렷해지는 순간. 무아지경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그 때에, 흙에서 한 줄기 선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만들어진 선에서 지극히 한국적인 단아함이 있을 때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나는 반갑고 기쁘다. 멀리 두고 떠나온 땅을 이 작은 흙 그릇을 통해 잠시나마 볼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도자기에서 그런 반가움을 느끼는 게 나 혼자만은 아닌 듯 하다. 올 여름 코퀴틀람 어느 여름 방학 캠프에서 도자기 시연이 있었다. 열 다섯 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한 캠프였는데 참으로 각양각색의 머리 색과 피부색이 섞여 있었다. 처음에 아이들은 책상에 멀찍이 앉아 준비과정 중인 나를 조용히 지켜만 보았다. 그런데 물레에 흙이 붙여지고 쌩쌩 물레가 돌아가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레 주위로 아이들이 죄다 몰려 들었다. 내 손 끝에서 흙 덩어리가 한 개의 잔으로, 접시로, 꽃병으로 솟아 오르자 아이들은 “쿠-울!” 소리를 내지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물레를 이용해 직접 자신의 도자기를 만드는 시간도 있었다. 흙의 균형이 내 손에 의해 유지된 상태에서 아이들은 컵을 만들었다. 어떤 아이는 흙의 느낌이 좋다며 밝게 웃었고 어떤 아이는 흙에서 물이 튈까 봐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손 끝에서 흙덩어리가 부드럽게 돌아가고, 위로 늘어나 마침내 컵 모양이 잡힐 때엔 모두들 탄성을 질렀다.
어른의 눈으로 볼 때야 우스꽝스런 컵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컵은 자랑스런 하나의 작품인 듯 했다. 컵을 받아들 땐 모두들 사뭇 조심스런 자세였고 제자리로 돌아가서도 한참 동안 자신의 작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지막 차례의 남자 아이는 중국사람처럼 보였다. 비쩍 마른 체구에 안경을 낀 그 아이는 별 말없이 나의 지시를 따라 컵을 만들었다. 작업을 마친 뒤 자신의 컵을 받아 들고 아이는 잠시 주춤거렸다. 필요한 게 있냐고 나는 영어로 물었다.
“아줌마, 한국 사람이죠?”
한국말이었다. 중국사람이라고 믿었던 아이의 입에서 나온 유창한 한국말에 나는 화들짝 놀라며 아이의 얼굴을 쳐다 보았다.
“그래, 나 한국 사람이야. 너도 한국사람이었구나!”
내 말을 듣고 아이는 그저 씨익 웃었다. 아이를 따라 나도 씨익 웃었다.
참으로 싱겁기 그지없는 대화였다. 그저 서로가 한국 사람임을 확인했을 뿐 그 아이도 나도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웃음을 머금고 제 자리로 돌아 간 그 아이를 나는 잠시 바라보았다. 너무나 조용히 있어 눈에 뜨이지 않았던 아이였다. 아직 영어보단 한국말이 익숙해 보이는 이민자인 듯싶었다. 저 아이도 예전의 내가 그랬듯 고려 청자니 도자기니 하는 것들에겐 별 관심이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축이라면 혹 고려 시대에 청자가 유명했다는 소리는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부모를 따라 건너 온 이 낯선 땅에서, 머리색과 피부색이 다른 친구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예술 작품으로서 우리 도자기를 예기치 않게 접하게 됐을 때,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반가웠으려나. 그런 반가움에 용기를 내어 자신도 한국 사람이라고 내게 한국 말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도자기 시연 장소에서도 나는 그 아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곤 한다. 때로 그 사람은 얼굴이 주름으로 얽혀 있는 노인이기도 하고, 때론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젊은 아버지이기도 하다. 도자기 만드는 것을 보겠다고 빽빽이 서 있는 캐나다 사람들 틈에서 그들은 작지만 흥분된 한국말로 말을 건네 온다. 한국 사람이시네요…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일이다.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자신이 한국 사람임을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들. 그리고 그것이 불쾌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이었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들…물레를 돌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나를 벅차게 한다.
2008년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작 (가작)
마음을 위한 청원(請願) / 설산 성영수
똑 같은 잘못 저지르고
후회하는 어리석음 없도록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가장 작고, 적은 것에 만족하는
가벼운 마음 담아 주시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십시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소박함으로 채워 주시어
늘 만족하는 마음이게 하십시오.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함 주시어
더불어 사는 모습이게 하십시오.
하느님 은총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 나누는 도구이게 하시며
들은 말씀 기억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이게 하십시오.
구름처럼 흔적 없는 그림 그리고
바람처럼 살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가난한 마음 이길 청원합니다.
저무는 가을
김세라
가문비나무 우는 숲에
꽃달이 지니
길 따르던 별 한 잎
못내 서럽구나
냉랭한 산머리위로
하늘빛 흐르니
서리 나르던 찬바람
이랑에 눕는다
식어 가는 햇살이 아쉽구나
함께 하자던 가을은
알몸 되어 길 떠나고
숨가쁜 붉은 잎은
몸져눕는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