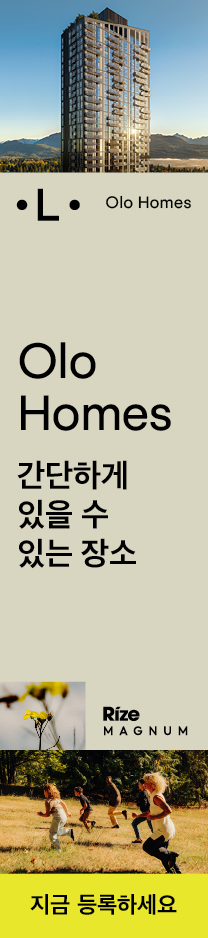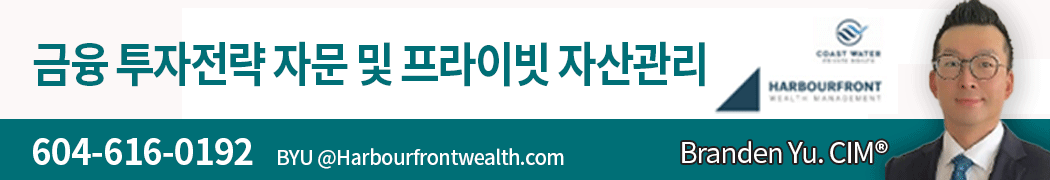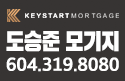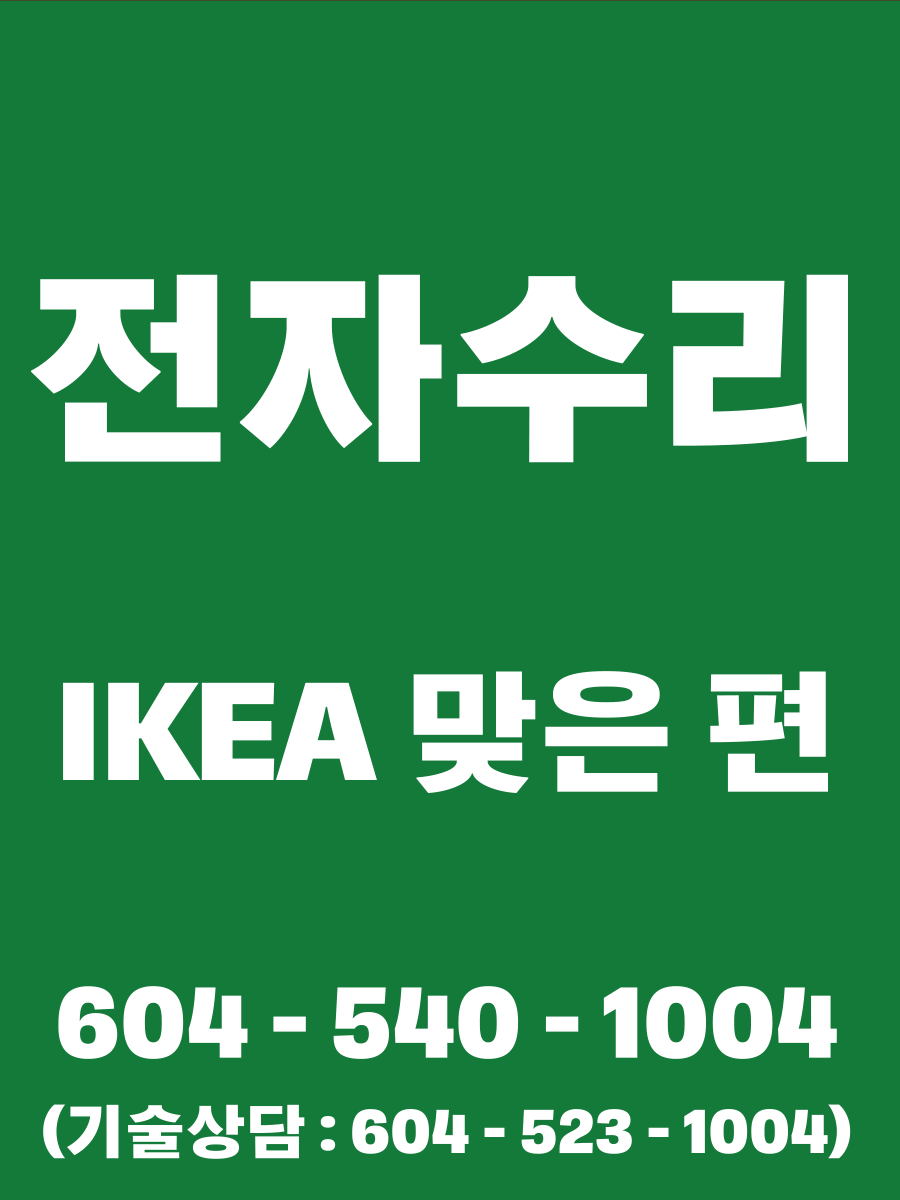獲罪於天(획죄어천)이면, 無所禱也(무소도야)니라.
직역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이 구절은 논어의 팔일편에서 공자가 한 말이지만, 이 짧은 문장을 대할 때마다 나는 윤동주의 그 유명한 서시의 첫 귀가 절로 떠오른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와 했다"는 윤동주의 피울음은 바로 진정한 의인(義人)의 독백이요 양심 선언이라 할만하다.
윤동주가 우리 현대 문학사에서 보석같은 존재의 성자 시인으로 추앙되고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거의 모든 지성인 문인들이 뒤질세라 곡필아세(曲筆阿世)하던 시대를 향해 사자후를 토해낸 진정한 조선의 양심이 있었다면 한용운과 윤동주 외엔 없지 싶다.
정치 권력에 염증을 느껴 천하를 주유하며 자기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고 싶었던 공자는 어느날 위나라에 당도한다. 실세인 왕손가가 공자에게 넌지시 야유하는 투로 이런 말을 한다. "안방 신보다는 부엌신한테 잘 보이는 것이 실속있지 않겠소(王孫賈問曰 與其媚於奧 寧媚於俎 何謂也)”라며 속을 떠본 것이다.
공자가 '상갓집 개'(喪家之狗)라는 별명을 얻을 만치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거리는 구직행위를 보고 왕손가가 매우 얕잡아 보고 던진 뼈있는 핀잔이 바로 위의 구절이 나오는 팔일편 13절이다. 여기에 대해 공자는 준엄하게 일격을 가한다. 공자가 가진 언어의 힘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새로운 차원에서 모든 논리를 묵살시키는 선문답 같은 언어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즉자성(spontaneity)에 있다. 그는 말했다. "그렇지 않소.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소"라고. ‘나는 성주대감이나 조왕신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인간세의 이해득실을 따져 헤아리는 그런 해바라기 인간이 아니다. 나는 하늘아래 떳떳하게 서고자 할 따름이다. 하늘에 죄를 짓기는 정말 죽어도 싫다.’
그렇지 아니한가. 빌 곳이 없는 인간처럼 비열한 인간이 어디 있을 것인가. 한국의 모든 지성인들이 본의든 타의든 과거의 친일 행적 때문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정말 제대로 우러러 볼 수 있었겠는가를 우린 쉽게 짐작한다.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굽히지 않는 삶" 바로 이것이 하늘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도 그렇지 아니한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다. 그러한 삶은 시공을 초월하여 벅차게 아름다울 뿐인 것이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