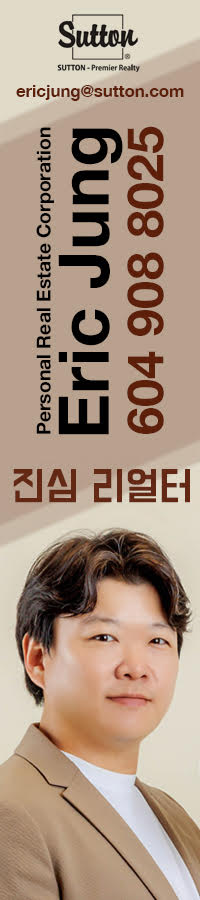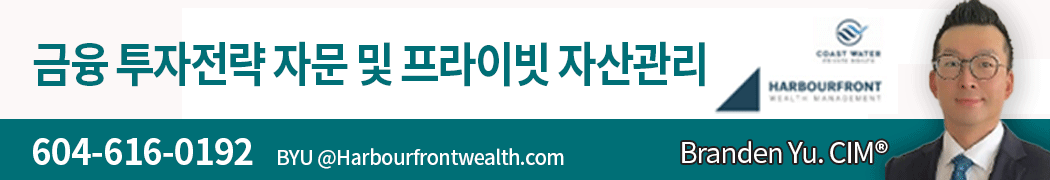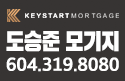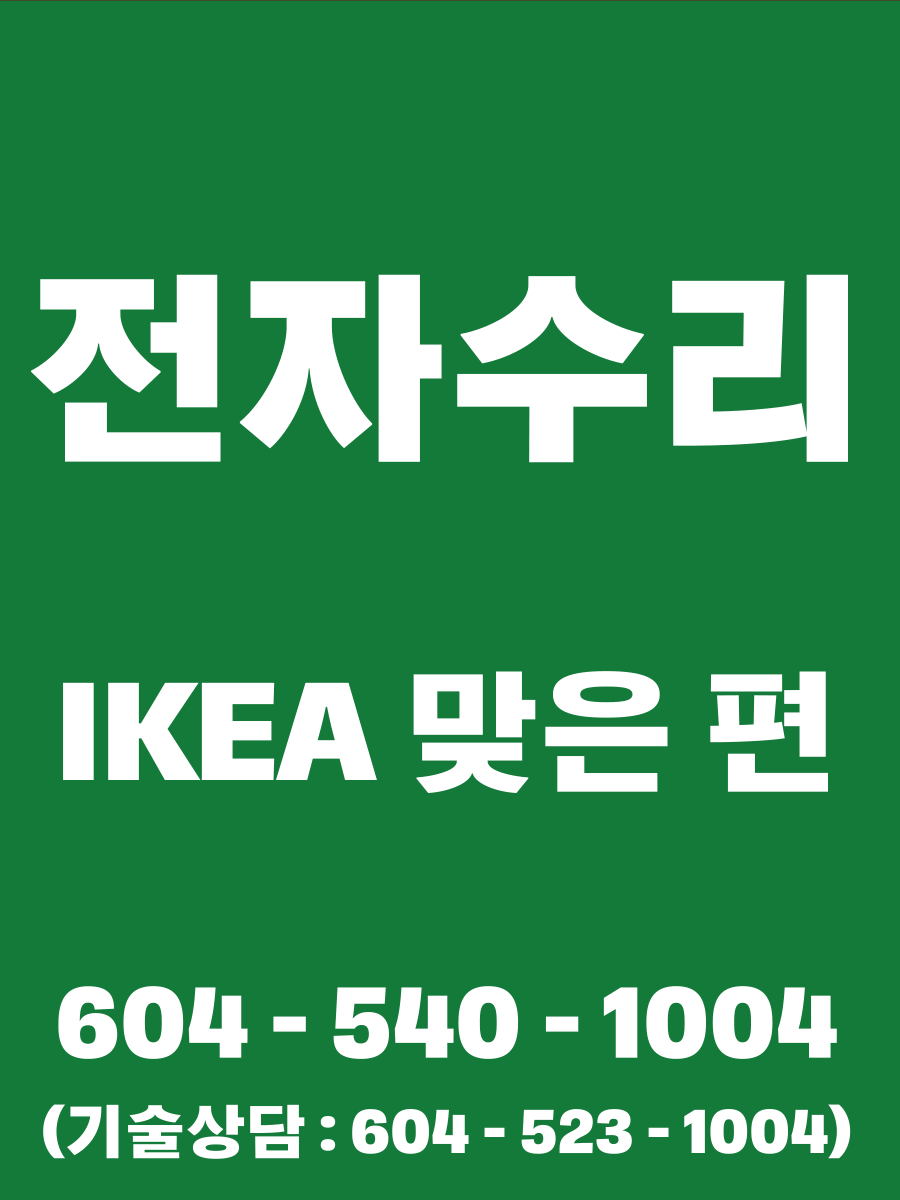3. 한국 문화의 정체성
한 문화권의 문화적 전파는 흔히 중심부 문화가 주변부 문화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 흐르듯이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말한다. 이것이 언필칭 문화전파론이다. 그러나 한 문화권의 문화가 전개된 실상을 보면 일방적 내지 의도적 전파라는 면보다는 주변부 문화의 적극적 수용이라는 면이 더 강하다. 독일의 르네상스에서 알브레히트 뒤러가 보여준 노력 없이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류 역시 하나의 문화 전파인데 문화공급국인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라 문화수신국의 적극적 수용에서 일어난 현상인 것과 같다.
세계 문화사에서 종교적 전파를 제외하고는 중심부에서 주변부에 선물을 주듯 전해준 예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국인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궤도를 같이했다는 사실은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갱신을 통하여 중심부에서 일어난 새로운 문명에 낙오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중국의 문명에 낙오하지 않으려고 애쓴 것은 정말로 피눈물 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신라시대 도당(渡唐) 유학생들은 보통 20년, 30년을 이역만리 이국 땅에서 인생을 바쳤다. 혜초 같은 이는 끝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시 <신라땅 고국을 바라보며(망신라)>를 남겼다.
고려시대 문익점은 고국의 의류 혁명을 위하여 목화씨를 밀반출해 왔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문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뜨거운 조국애를 볼 수 있지 않은가. 중국에 가는 사신들은 그들에게 지적으로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보다 풍부한 문사철(文史哲)의 지식을 쌓았다. 그리고 열성적으로, 때로는 극성을 보이면서까지 그들의 문명을 배우고자 했다. 그래서 송나라 소동파 같은 이는 “고려 사람들은 영리하여 쉽게 배워 가니 함부로 가르쳐주지 말라”는 중국인 스스로의 경계를 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어느 것 하나 문명국으로부터 이것을 사용하면 좋을 터이니 너희도 가져가 써보라고 내려준 문화의 전파는 없었다. 그것은 물질 문화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였다. 그 하나의 예가 도자기이다.
도자기, 그 중에서도 자기의 발명은 위대한 탄생이었다. 인간이 사용하는 밥그릇, 반찬접시 등 식용기에서 아직까지 자기보다 더 위생적이고, 사용하기 좋고, 보기 좋은 용기는 발명되지 않았다. 자기를 최초로 발명한 것은 중국이었다. 고월자(古越磁)라는 초기 청자가 만들어진 것은 대개 4세기 무렵이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이보다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10세기로 들어서면 완벽한 비색(秘色)청자를 만들어내고 12세기 송나라 휘종황제 때는 그 절정에 달한다.
중국에서 고월자(古越磁)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비색청자를 생산하는 것을 보고 고려인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11세기에는 높은 수준의 고려청자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12세기 인종, 의종 때는 송나라가 자랑하는 여요(汝窯)와 맞먹는 최상의 청자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를 비색(秘色)청자라 불렀다. 나아가 고려인들은 청자의 약점인 문양의 문제를 상감 기법으로 해결하여 상감청자의 길을 열었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상감청자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청자에서 그 문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고려인들의 상감기법을 수용하지도 않고 청백자의 길로 들어가 버렸다.
고려 이외의 어느 나라도 중국의 청자를 본받아 자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중국과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에서 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을 보면 베트남이 안남사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15세기, 일본은 조선 도공들이 아리타(有田)에서 백자를 만든 17세기이며, 유럽의 자기는 17세기 말 독일의 작센 공화국에서 마이센 백자를 만들면서 자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니까 10세기에서 15세기까지 500년 간 세계 자기의 역사는 중국과 우리나라만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에 고려마저 청자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세계도자사는 매우 밋밋했을 뻔 했다.
한국 문화의 정체성은 이와 같이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성 속에서 독자적인 성격의 특질을 보여 주고 있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당당한 지분율을 갖고 있는 문화적 주주 국가인 것이다. 그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액면가(양)로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실거래가(질)로 산출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일본 등이 중국 문화를 수용하면서 그들만의 문화로 발전시킨 것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내용을 살찌게 한 것이었다. 똑같은 중세 시대의 불상 조각이라도 중국의 불상, 한국 불상, 일본 불상, 베트남 불상의 모습이 다르다. 그 다양성이 바로 문화권의 풍부한 내용이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