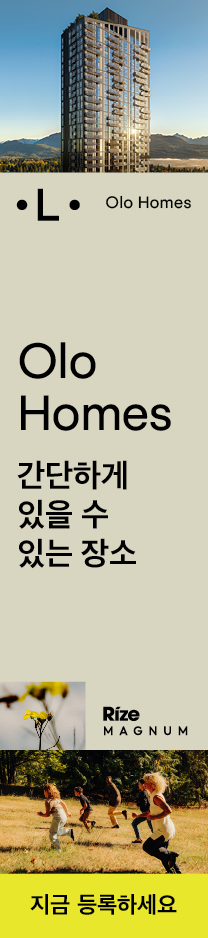- ▲ 김동석 스포츠부 차장대우
광저우 아시안게임 선수촌과 미디어촌에는 자원봉사자가 넘친다. 자원봉사자와 마주치지 않고 100m를 걸어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이들에겐 묘한 공통점 하나가 있다. "머리가 검은 사람 중에는 중국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귀를 가리키며 중국어 못 알아듣는다고 손을 저어도 막무가내로 중국어로 뭔가를 계속 설명한다. 거의 모든 외국 기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자는 총 59만명. 대한민국 육군(56만명)보다도 많다. 중국의 미래인 이 젊은이들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것처럼 중국어도 동양 공용어쯤은 된다고 믿는 듯하다.
아시안게임의 묘미인 한·중·일 3국 메달 경쟁은 오래전에 의미를 잃었고, 한국과 일본의 금메달을 합쳐서 중국의 절반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거리가 됐다. 중국은 지난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당시의 금메달 183개를 뛰어넘는 200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공언하고 있다. 도가 지나칠 만큼 휘황찬란한 개막식을 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큰일 났다. 우리는 개막식을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이번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중국적인 힘의 시위(示威) 현장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된다. 성대한 잔치에 초대받아 오기는 했지만 상석(上席)의 근육질 주인장 때문에 뭔가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꼽힌다. 중국이 강자인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냥 1위에는 만족할 수 없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둬야겠다는 편집적·강박적 태도는 이웃들을 질리게 한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선 사격에서 첫 금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국은 자국 전통 무술인 우슈 결승전을 대회 첫날 오전 8시 35분이라는 비상식적인 시간에 개최해 기어이 자국 선수가 대회 첫 금메달을 차지하도록 했다. 종목마다 중국에 유리한 편파판정이 이어지면서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한 TV 스포츠 해설위원은 "중국의 전국 체전에 우리가 게스트로 초대받아 온 느낌이 든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때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했다.
중국이 소국(小國)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국임을 너무 과시하려는 것, 주변국에 이를 인정하라고 윽박지르는 건 아직 진짜 대국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과정을 생략하고 빠른 결과와 승리에만 집착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청소년기의 특징이기도 하다.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입이 떡 벌어지는 개막식과 넘치는 자원봉사자, 시상대에서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중국 국가(國歌)의 와중에 서서 "이런 식이라면 대국(大國)도 소국(小國)도 아닌, 그냥 중국(中國)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조선일보의 다른 기사
(더보기.)
조선일보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