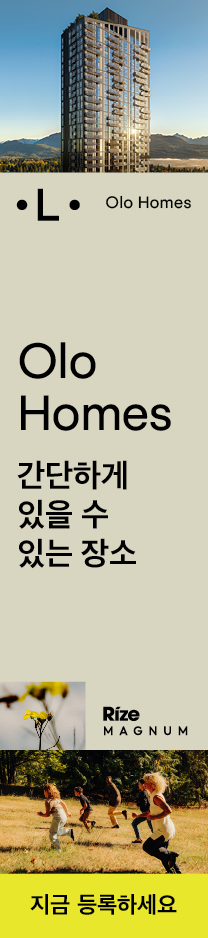김경묵 감독의 시선은 늘 ‘마이너리티’를 향해 있다. 특히 성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김 감독은 자신의 영상언어를 통해 사회적 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불편한 사실에 대해 얘기하고자 했다.
이십대 젊은 감독은 ‘나와 인형놀이’ ‘얼굴 없는 것들’ ‘청계천의 개’ 등의 작품을 통해 주목 받았고, ‘줄탁동시’로 밴쿠버 국제영화제의 초대를 받았다. 그는 용호상 후보 명단에 자신의 이름 김경묵을 올렸다. 용호상은 출중한 작품세계를 보여준 아시아의 젊은 감독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밴쿠버 국제영화제를 찾게 된 건 이번이 두번째에요. 지난 2006년 때도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도시가 제겐 친근하고 그리 낯설지가 않네요.”
김 감독은 고교를 자퇴했다. ‘공부보단 영화가 미치도록 좋아서, 혹은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라는 다소 식상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답답함과 싸우고 있었다.
“저 자신이 성적 소수자에요.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해 글을 쓰기도 했고 카메라를 접한 후에는 영화로 표현했죠. 제 첫 작품도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 그 영화를 통해 흔히 말하는 커밍아웃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첫 영화 이후 ‘센 영화’들이 이어졌다.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경계의 선을 넘어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었다. 그가 원하는 소통은 비단 변화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영화를 통해 사회운동을 하자는 것도, 어떤 변화를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민자 사회도 서로 다름에 대해 인정해야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게 김 감독의 생각이다.
“출신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와 내가 같다’라고만 주장하면 캐나다는 네이티브 캐네디언만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 감독은 문제거리를 툭 던져주는 그런 영화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그 문제거리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것이다. 김 감독의 희망대로 ‘다름’을 인정한다면 말이다.
글=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 사진=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문용준 기자 의 다른 기사
(더보기.)
문용준 기자 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