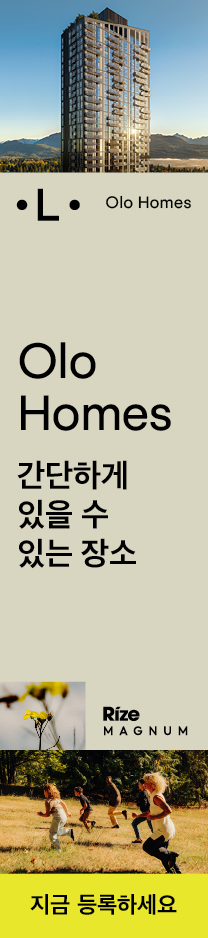윤의정 / 캐나다 한국문협
현관에 등이 나갔다. 센서 등인데, 집 안에 있을 땐 전혀 불편함이 없다.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나가는 그 순간에만 깜짝 놀랐다. 어둡다. 신발을 신으러 혹은 벗으러 들어선 현관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깜깜하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아, 등 갈아야겠다.’
그래도 집 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등을 갈아야 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내 일을 하기 바쁘다. 아니 실은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남는 시간에 마음껏 바쁘게 쉰다. 잠깐 사이 아이들이 오는 시간으로 넘어간다. 이 시간에 알뜰하게 쉬지 못하면 다시 저녁이 된다. 저녁엔 더욱 더 완전히 쉬어야 한다. 저녁이 있는 삶이란 저녁 시간을 더 이상 일하는 데 할애하지 않는 것이니까.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덕분에 현관의 등이 나간 것 따위는 크게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낮 12시가 되기 1시간 전쯤 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받지 못했다. 정확히는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한테서 온 전화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 발신 버튼을 눌러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안녕하세요. 아이를 학교에 보낸 어미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한다. 어쨌든 아이가 거기에 있으니까. 심기를 거슬리지 않을까,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을 정리해서 조심스럽게 단어를 뱉는다. 대화를 시도한다.
“아이가 학교생활을 힘들어해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자꾸 행패도 부리고, 거짓말도 합니다.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에 대해서 고민을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찾아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아주 짧은 대화였다. 시간이 채 2분이 지나지 않았다. 숨을 크게 쉬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혀 나아지지 않는 기분이다. 거실을 어슬렁 걷는다. 물을 마신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떤다. 아무렇지 않더라.
화요일에 가서 대화를 해보는 게 낫겠다. 주방에서 거실로 오가는 중 현관 앞을 지난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등이 꺼져 있었구나. 등을 바꾸러 가야겠다. 노란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와 등을 만진다. 불투명 유리 덮개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꿈쩍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시도한다. 여전히 변함이 없다. 왼쪽인가 보다. 다시 왼쪽으로 돌린다. 슬슬 돌아가며 풀린다. 드러난 센서 등의 전구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다. 전구를 빼어 들고, 슬리퍼를 꿰어 신고 K전기로 걸어간다. 날씨가 참 좋다. 맑은 날이다. 나는 멀쩡한데, 화요일에 가서 대화를 하면 되는데, 턱 끝이 끈적이는 물기로 젖는다. 길가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전구 사러 가는 길은 50 발자국 정도. 짧은 거리다. 그 사이 얼마 전 그만둔 헬스클럽의 관장님이 걸어온다. 건장한 걸음을 걷는다.
“안녕하세요?”
스포츠맨은 늘 인사도 스포츠처럼 한다. 남자의 굵은 하이톤.
“아, 네. 안녕하세요?”
반사적으로 나도 하이톤. 아무렇지 않게 떨림이 섞인 소리가 나간다. 덩치 큰 남성이 동그랗게 눈을 뜨고 쳐다본다. 어울리지 않게 각진 얼굴에 동그란 눈이라니.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사를 건 내가 아니니까. 안녕하지 않아도 안녕하다고 하라고 배웠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곳에선 늘 안녕하다고 하라더라. 실제 안녕은 관계가 없다. 그냥 이유 없이 안녕 하라고 하니깐 조건반사처럼 안녕하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고 싶다. 매일 인사처럼 안녕하기가 쉽지 않던데,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 나도 안녕한지는 잘 모르겠다만 일단 그렇다고 한다. 생각을 안 해본 지 오래된 일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 한다고 선생님이 얘기 하던데. 아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집에 돌아와서 전구를 갈아 끼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의자에서 내려와 이리저리 걸어본다. 여전히 그대로다. 센서 등이 망가졌나 보다. 다시 K전기로 간다. 이번엔 센서 등을 갈리라. 등 전체를 갈면 불이 들어오겠지.
“1시간 안에 가서 갈아드릴게요.”
인사를 하고 집으로 온다.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우렸다. 우롱차라고 하는데, 이 맛이었나. 나는 우롱차는 마시지 않는다. 커피만 마시는데, 오늘은 차라는 것을 우려서 먹기로 했다. 센서 등을 갈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차를 마시며 보내는 게 어울리는 것 같다. 30분이 안 되어 아저씨가 온다. 등을 갈아주신다. 너무 환하다. 거실보다 더 환한 현관이라니. 백색 LED 등으로 바뀐 현관에서 가만히 기다린다. 등이 너무 밝아 나사를 조이지 못해서 기다리는 거란다. 센서의 등이 꺼져야 빠르고 신속하게 두 개의 나사를 조일 수 있으니까. 눈이 부시다. 그래서 이번엔 눈물이 난다. 눈이 부셔서 나는 눈물이다.
아이를 데리러 가자. 30분이나 남았는데, 방과후 수업을 하는 곳에 가서 복도 끝에 서있다. 3명쯤 다른 반 선생님을 만난 것 같다. 2명쯤 학부모를, 3명쯤 방과후 선생님을 만난 것 같다. 작은 목례를 하고 가만히 서 있다. 30분은 길더라. 바쁘게 쉬던 시간과 다르게 느리게 기다리는 시간이다.
아이가 나왔다. 손을 잡고 길을 걸었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아이가 부른다. 대답하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학교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가 자꾸 부른다. 간신히 숨을 멈추고 빠른 걸음으로 학교를 벗어났다. 후 우 한숨 쉬고 아이를 본다. 울었던 것도 같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소리를 친 것도 같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마지막은 아이가 나를 잡아서 집으로 끌어당겼다. 크게 울음을 놓으며. 아이가 힘이 셌던가. 또래보다 작은 아이인데 힘이 셌구나. 다른 아이들한테 행패를 놓기에는 너무 작지 않던가요? 아까 말하지 못하고 삼켰었는데, 잘 했던 것 같다. 아이는 힘이 세더라.
집에 들어왔다. 바깥보다 밝은 현관이라니. 아이 얼굴의 얼룩이 선명하다. 땟물이 진 얼굴을 침을 묻혀 닦아주었다. 침 냄새, 입 냄새, 먼지 냄새. 아이의 얼굴에서 냄새가 난다. 유리에 비친 얼굴, 턱 끝이 까맣다. 아이가 울며 웃는다. 나도 울며 앉는다. 그리고 안는다. 아이를. 훤한 현관에서 숨을 죽이고 함께 있다. 밝은 빛은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고 하던가.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그렇게 배웠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윤의정의 다른 기사
(더보기.)
윤의정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