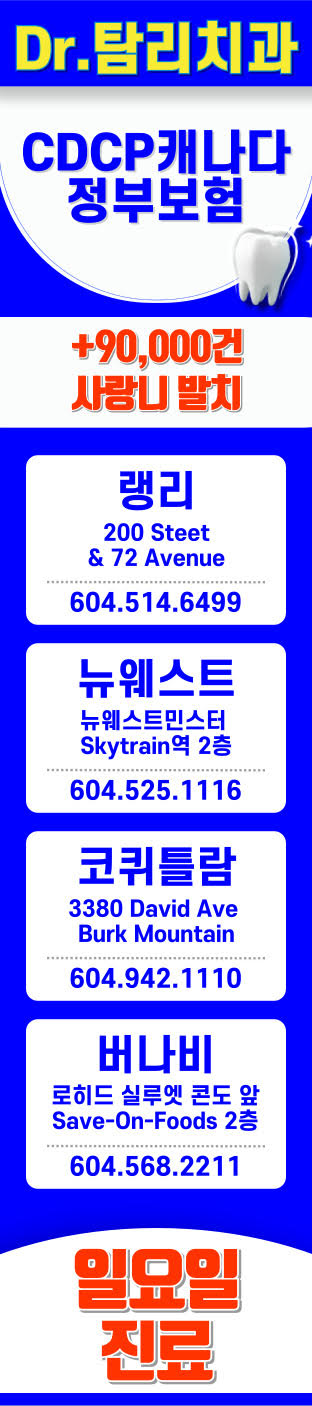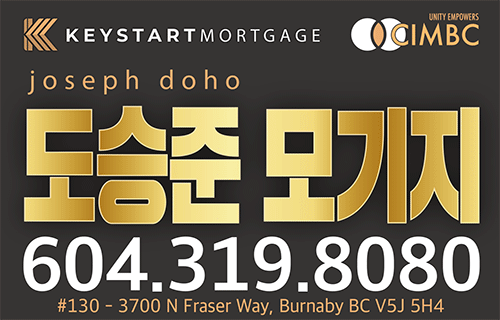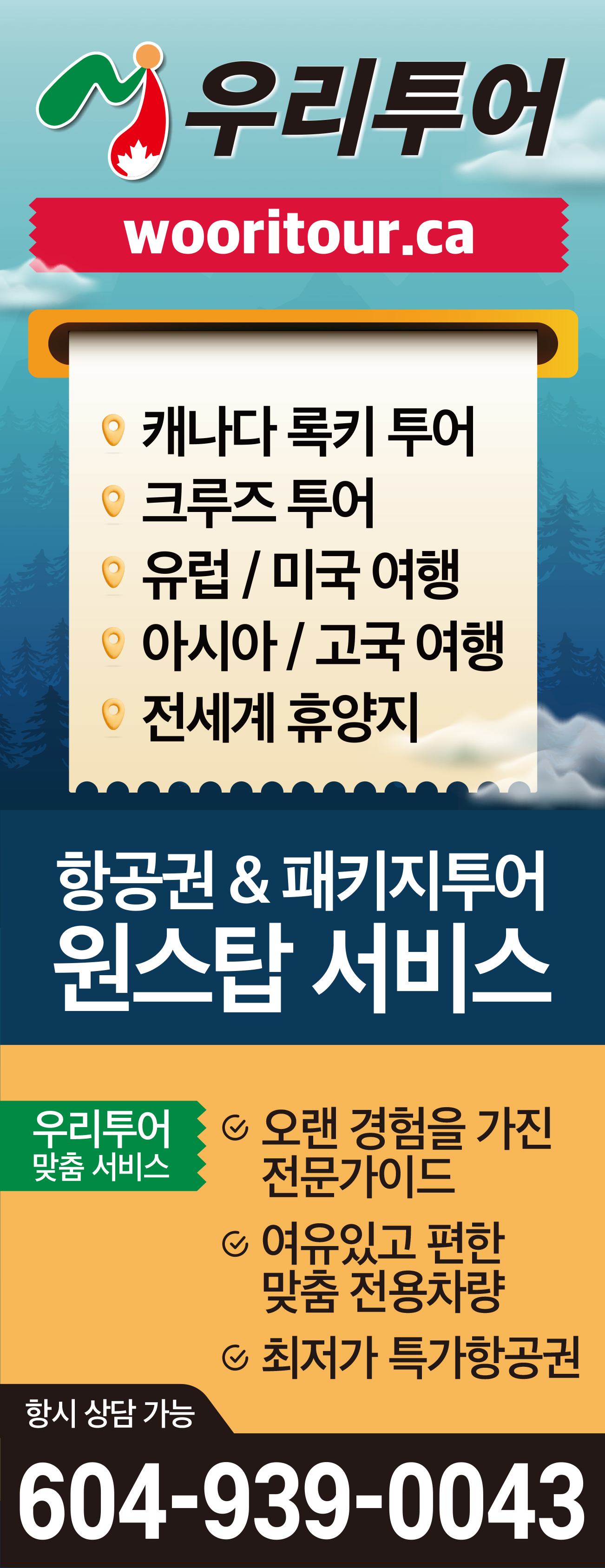민정희 / (사)한국문협 밴쿠버지부 회원
누렇게 뜬 무청이 눈에 띈다. 괜히 억척을 부렸나 보다. 어제 다용도실에 놓아두고 늦은 저녁을 먹을 때까지는 기억하고 있었다. 깜박하고 반나절이나 지난 지금 생각난 것이다.
성당 후문에는 일요일에만 오는 야채 트럭이 있다. 밭에서 직접 따온 신선한 야채에 늘 마음이 끌렸지만, 오후에 약속이 있거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기에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었다. 어제 미사를 끝내고 서둘러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미사 후 부부 동반 모임이 있기 때문이다. 야채 트럭 앞에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언뜻 보이는, 싱싱한 채로 쌓여 있는 푸른 무청이 나를 잡아끌었다. 모임에 가야 한다는 생각도 잠시 잊고 저절로 빨려가듯이 내 발길은 그 줄 끝을 향했다. 약속 시각에 늦겠다고 남편이 만류했지만, 잠깐이면 된다고 차에서 기다려 달라는 다짐만을 남겼다.
줄은 줄어들 생각이 없었다. 한 10분이면 되겠지 했던 예상과는 달리 거의 30분가량을 소모하고서야 내가 원하는 야채를 살 수 있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겠다. 아니, 지금쯤 화가 나 있겠다 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고 조바심이 났지만, 줄 서 있던 시간이 아까워 좀처럼 포기할 수가 없었다. 물건을 사면서도 초조하여 이것저것 고르지도 못했고, 심지어 잔돈을 받았는지 확인하지도 못한 채 무거운 야채를 들고 뛰었다.
주차장 입구 어딘 가에서 기다릴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차는 보이지 않았다. 숨이 턱에 차도록 3층 주차장까지 뛰어가니 차에 시동을 켠 채 기다리고 있는 남편의 굳은 표정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미안한 얼굴로 차에 오르니 순간 억울함이 밀려들었다.
서로 말 한마디 없이 긴장만을 실은 채 모임이 있는 집에 당도했다. 여자들은 다이닝 룸에 남자들은 뒤뜰 테크의 테이블에 앉아, 오는 순서대로 음식을 담고 있었다. 그중 한 분이 성당에서 벌써 나가는 것을 봤는데 왜 이제야 왔느냐고 물었다, 누르고 있던 화가 다시 솟아오르며 가슴 속에 고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분이 대답했다. “자기 남편은 착한 거야. 우리 남편 같았으면 벌써 가버렸어. 마누라가 오거나 말거나.” 또 한 사람이 “자네 남편은 약속 시각에 늦게 가는 것이 싫었고, 자네는 무청을 때맞추어 사기 어려우니 눈에 띄었을 때 사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 둘 다 옳아.”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분이 “그래서 판사가 필요한 거여.”
웬 판사? 부풀어 있던 감정에 바람이 빠지듯 피식 웃음이 나왔다. 들어주고 다독여 주며 우스갯소리까지 하는 나이든 분들의 넉넉한 마음에, 별일도 아닌데 흥분했다는 머쓱함마저 들었다. 언제쯤 나도 저렇게 느긋하고 초연해질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혜로워지는가에 대한 물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젊음과 늙음의 경계는 어디쯤일까. 하면 된다와 해도 안된다는 인식의 전환점인가. 전에는 잘했지만, 점점 잘할 수 없게 되는 한계의 시점부터인가. 나 역시도 이순을 넘기면서 여러 가지 육체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나만은 언제까지나 젊으리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거부하려 해도 순환에 따른 자연의 섭리이니 어찌 피해갈 수 있으랴. 순응하며 받아들이려 하니, 우선 힘있게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된다.
욕심의 부피가 줄어든 만큼 채워지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로움이 바로 초연함의 비결일 수도 있겠다.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무조건 뛰어들지 않고 한걸음 뒤로 물러나 관조할 수 있는 여유 또한 내려놓음 때문이리라. 운동하거나 악기를 다룰 때 힘을 빼는 것이 기본적인 요소이며 결국 완성으로 이르는 단계가 아니든가. 나이가 들면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숨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어차피 제때 조리하지도 못할 무청을 미리 사놓기 위해 남편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욕심 때문이었다. 사기 전에 조리할 시간은 되는지, 바쁜 스케줄에 몸은 허락할지를 먼저 살펴야 했다. 몸으로는 나이 듦을 느끼지만, 아직도 욕심이 앞서고 감정의 성급함이 남아 있으니 마음은 아직 젊음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가 보다.
남편이 보기 전에 얼른 무청을 다듬는다. 무는 아직 흙이 묻은 채 싱싱하다. 누런 잎을 떼어내는데 서운함도 욕심도 함께 떼어낸듯 편안하다. 애초에 무청은 데쳐 말려 시래기를 만들고 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깍두기를 담글 생각이었다. 모두 한꺼번에 절여 깍두기에 버무린다. 사는 일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에.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민정희의 다른 기사
(더보기.)
민정희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