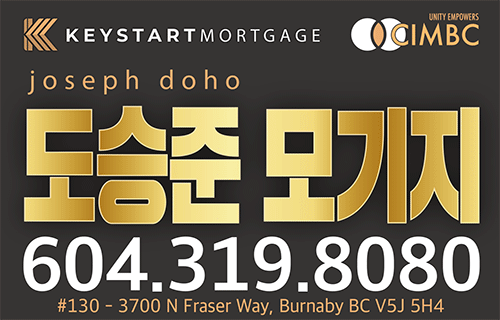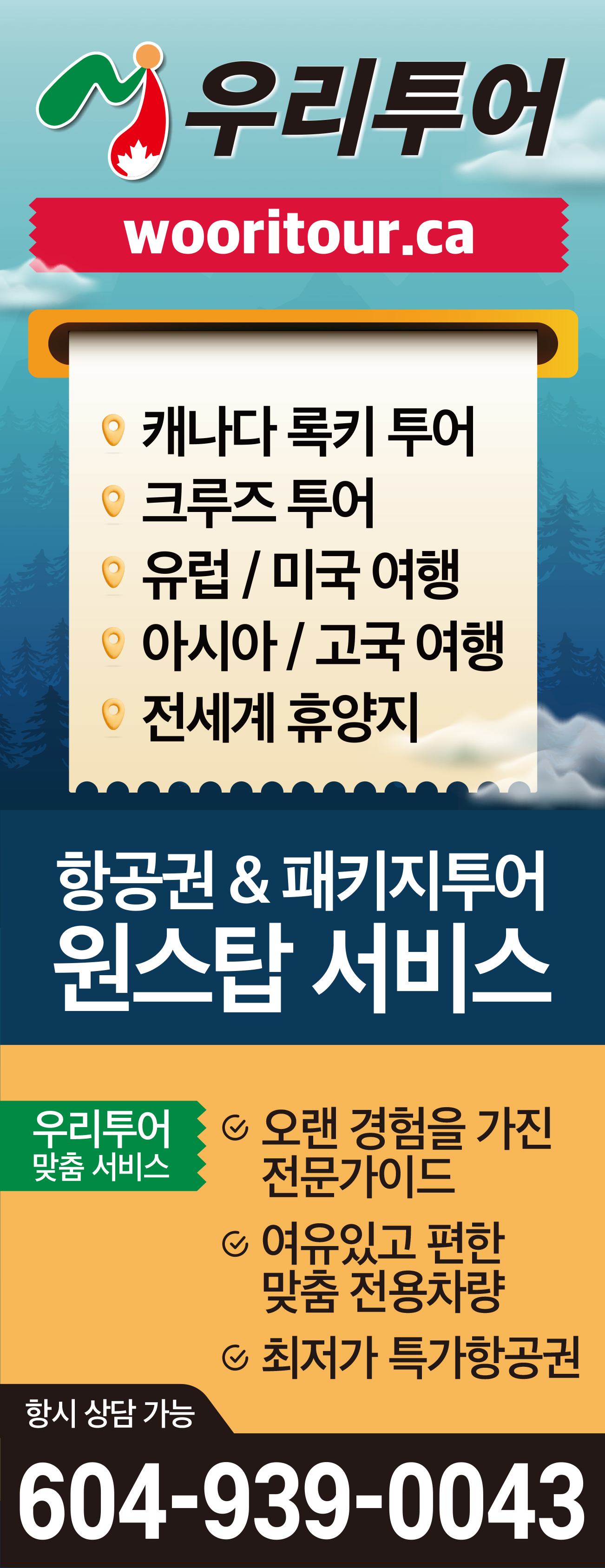권애영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한참 내 자신에 대해 초라함을 느끼던 때였다. 한없이 작고 형편 없이 느껴지는 나날이었다. 내가 다닌 학교와 직장, 그리고 사는 집 그 어느 것 하나 주류에 속하지 않다며 한탄했다. 그 원인은 무얼까?
스스로 판단하건대 이제 와 다른 학교에 다닌다 해도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내가 이십 여 년 가까이해 온 직업을 벗어나 맨 땅에서 헤딩할 자신도 없거니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빌려 살 수는 있을지언정 살 수는 없음이어서라 생각했다.
아니다. 현실 탓이 아니다. 삶이란 어쩌면 신화 속 시지프스가 받은 형벌과 같은 것이므로 무력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바위를 끌고 올라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참으로 철학적인 질문에 까지 와 닿았고 그 답은 오랫동안 찾을 수 없었다.
아니다. 실상은 어쩌면 이불 킥 사연이 난무해서일지도 모른다. 누구 하나 자잘한 실수 하나 없이 살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난 그렇게 자신에 대한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날 시기한다고 여기는 이들을 험담 했다가 그 말을 곱씹고 있는 자신에게 화가 났고 내 일의 실수를 지적하는 이들을 비난했다가 좀 더 완벽하게 일 처리 했으면 그런 부당한 대우는 받지 않았을 거라 자책했으며 여기에 괜한 자격지심까지 더해 만 갔다. 그렇게 지옥이 있다면 여기지 않을까 하는 곳에서 벗어나고 물리적 시간 상으로는 가족보다 더 촘촘하게 보낸 이들과 완전한 종말을 고했다.
흔히 들 말하길 이 모든 증상은 우울증에 가깝다. 그러기에 이를 벗어나야 했다.
원인은 찾았으니 늘 그렇듯 관련 서적을 읽어보고 해당 유튜브 영상을 뒤져보며 그 해결책을 찾아 내기 위해 분주해졌다. 공통 분모를 찾아 따라도 해보았다. 새벽 5시 기상하여 공부하기, 명상 하기는 물론 뻣뻣한 몸으로 발레도 배워보고 미친 듯 달리기에도 몰두해 보았다. 잠시 잠깐 보람과 희열로 그 병세는 약화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문득 문득 차오르는 억울함과 분노 지수는 쉽게 낮아지는 것 같지 않았다. 열심히 뛰었으나 뒤돌아보면 다시 제자리인 다람쥐 쳇 바퀴에 갇힌 신세 같았다.
그래서 택한 것은 아니지만 우연인 듯 운명인 듯 나는 낯선 땅, 캐나다에 새 둥지를 틀었다. 어차피 낯선 곳에서 익혀야 할 것도 많거니와 최대 난제인 영어라는 언어를 정복해야 하기에 다시 새벽 기상과 공부에 몰두했다. 캐나다에서는 부모가 특정 조건을 갖춰 대학에 다니면 아이가 다니는 공립 학교 비용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목표가 생기니 몰두할 수 있었다. 몇 번의 공인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갈 입학 조건을 맞췄다. 그렇게 일 년 채 안 되어, 대학에 갈 서류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다. 아이는 아직 어리고 내가 학교에 다니면 이곳에 온 가장 큰 목표이자 목적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기 어려우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돌아보면 변명이다. 그냥 가기 싫어진 것이다. 함께 알아봐 준 유학원에 사과와 함께 취소 문의를 하고 말았다. 그리고 또 한참을 속으로 앓았다.
온전한 감정과 사고가 아닌 회화를 위한 생각하기와 말하기, 시험 용 글쓰기에만 몰두한 일 년이었다. 더불어 생존에 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이들과만 교류했다. 공부와 진학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인간관계를 자연스레 접었다. 나의 인간관계는 솜사탕의 설탕 줄기 같았다. 일단 살아남아야 하기에, 또한 잘 해내고 싶은 욕심에 남들이 정한 선에 도달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뜀박질도 해보고 무리해 점프도 해보며 간신히 가까이 가고 나면 또 다른 선이 보였다. 그래서인지 우울하고 무력한 증세는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시소게임 같았다.
또 한 번, 벚꽃이 피는 계절을 맞았다. 집 주위 크고 작은 공원이 넘쳐 나는데 몇몇 어르신들이 꽃밭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문득 어른들은 왜 이리 늘 피고 지는 꽃구경을 할까, 의문을 품던 시절이 떠올랐다. ‘꽃구경에는 국경이 무의미하네.’ 혼잣말하며 하교를 재촉하는데 문득 내 시선과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있다. 아스팔트 사이에 무심히 핀 작은 꽃과 새 순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내게 소리 없이 말을 건네는 듯했다. 폭풍우가 몰아쳤건 가뭄으로 허덕였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았든지 간에, 길가에 이름 모를 이들마저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 언제가 꺾이고 밟힐지언정.
그렇게 그들이 건넨 조용하고도 묵직한 메시지를 곱씹던 참에 영어도 배울 겸 챙겨보던 드라마, <굿 플레이스(good place)>의 마지막 회를 보았다. 지난 일 여 년 동안 드라마를 보며 형이상학 적 윤리와 도덕, 삶에 대해 생각했다. 좋은 인간이란 어떠해야 하며 선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린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드라마를 보면 늘 궁금해 온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주인공은 마지막 장면에서 “테이크 잇 슬리지(take it sleazy)”라고, 이웃에게 겸허히 조언한다. 이는 영상에 나온 자막대로 ‘천하게 지내세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생에 끊임없이 고난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해결하는 데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며 집착 부리지 말자.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그 속에서 성장을 해나가는 존재일지 모른다고. ‘테이크 잇 이지(take it easy)’를 잘못 발음하는 실수를 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는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을까. 실수가 없는 신 적인 존재인 주인공이 인간 세계를 경험하며 우주의 모든 지혜를 담아 우리에게 하는 말이니 이건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답이자 자신에게 해주고 픈 말인지도 모르겠다.
잘 지내는지 먼저 전화하는 가족, 시 답지 않은 농담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가 있다. 그리고 내 어깨를 짓누르는 짐을 덜어주고자 일까. 뜬금없이 ‘너만 한 사람 없다 더라, 역시 수상자는 다른가 보지’ 라며 한껏 치켜세우며 연락하는 이십 년 지기 동료도 있다.
그제야 비로소 절절히 깨닫는 것이다.
치료 약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 와서 야, 그것도 한참을 앓고 나서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로소 명 약을 찾은 것이다. 아니다. 어쩌면 해독제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인생이란 산 꼭대기를 오르는 투쟁 속에 행복이 존재한다고.
함께하는 누군가 가 있기에 그 길은 갈만하다고.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권애영의 다른 기사
(더보기.)
권애영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