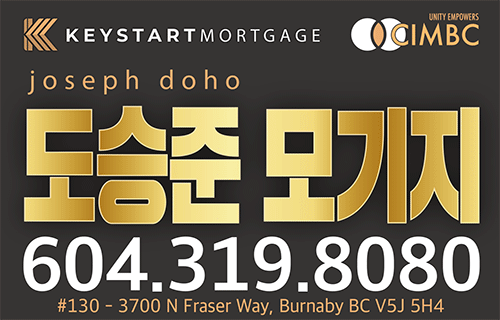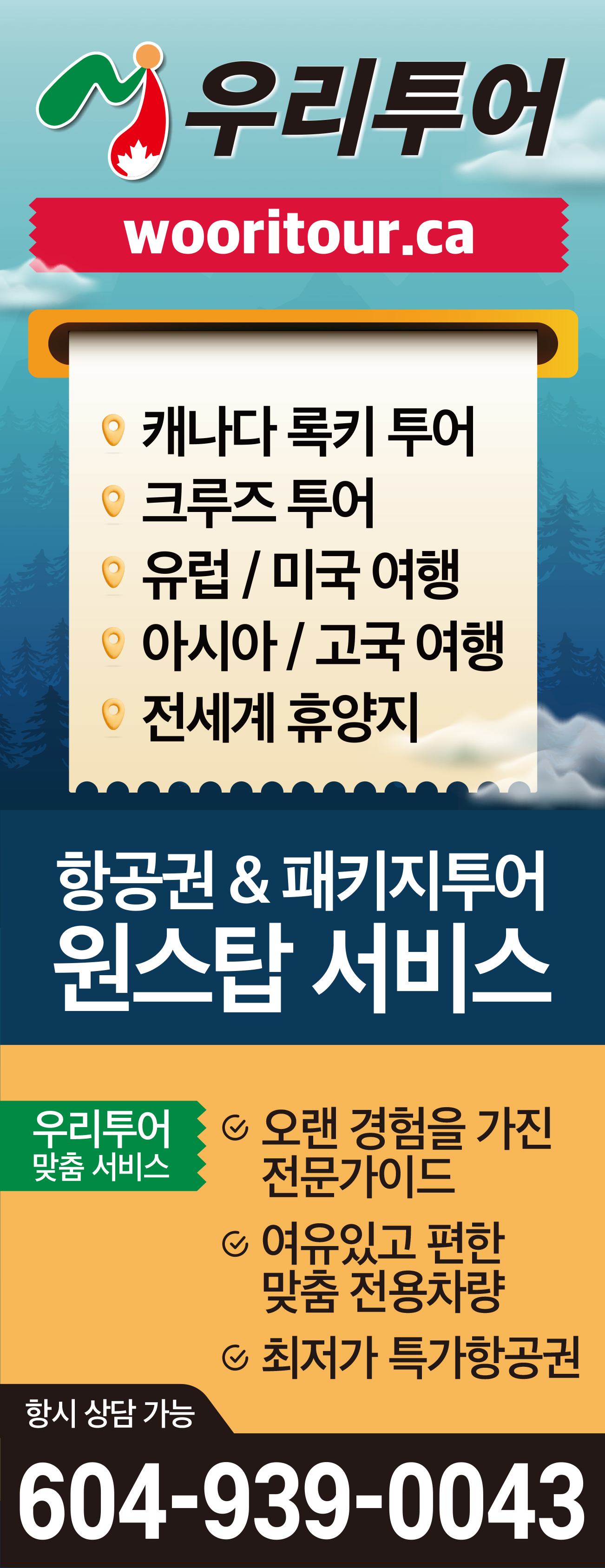박혜경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어렴풋한 어릴 적 기억 속 아우의 조그마한 얼굴이 보인다. 너무 허약한 체질이어서 나이가
들도록 걸음마조차 떼지 못한 채 간신히 기어 다니기만 하였다. 한참 후 동네 어른들의 훈수에
따라 개울을 뒤져 개구리를 잡아 구워 주었는데 특효약이 되었는지 걷기 시작하였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며 형편과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살갑지 못한 형이었다. 캐나다에
도착하여 얼마 되지 않아 과자를 유난히 좋아하던 50이 넘은 아우에게 과자 사 먹으라 내민
지폐를 받으며 멋쩍게 웃고 있었다. “언니 눈에는 내가 아직도 어린애이지?” “응. 너 좋아하는
초콜릿과 리즈 크래커 사 먹어.”
우리는 어려서도 무척 이질적 기질이었다. 내성적인 형은 속내를 별로 내주지 않았고 예술가적
기질이 풍부한 아우는 늘 삶과 고약한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자기 자리를 지켜 내려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었다. 도저히 인내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외줄타기 하며 끊임없이
운명에 저항하여 싸우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화폭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궁색하게 캔버스를
마련하여 그림을 그리며 현란한 색채의 환영과 풍부한 이상을 쏟아 내고 있었다. 그것은 때로는
하늘과 땅으로, 가상 시조새의 모습으로 그리고 다하지 못한 이야기의 줄거리가 되어 영롱한
색으로 엮어졌다가 섞이기도 하며 화폭 속에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후드득, 똑 똑 양철지붕을 두드리며 떨어지는 빗소리를 유난히 좋아했는데, 아우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은 하늘이 높고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봄날이었다. 무엇이 그리 급했던지 이렇다 할
말 한마디 남기지 않은 채 황급한 걸음을 재촉하였다. 문득 치오르듯 엉켜버린 슬픔을 목구멍으로
삼켜 보낸다.
그림을 놓는 날이 죽음이라 말할 때 난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에게는 애처로운 동생의
곤두박질친 삶이 미워질 뿐이었다. 마지막까지 새로운 작품 구상으로 설레며 아우는 벅찬 기쁨을
나누어 주었건만 안타깝게도 유작을 마치지 못했다. 아직도 믿기지는 않지만 ….
떠나가며 나에게 선명히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 너무 평화로웠기에 다소나마 위안을 삼으며
천국에서 “언니! 참 좋다” 하며 씩 웃어넘길 아우를 그리워해 본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박혜경의 다른 기사
(더보기.)
박혜경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