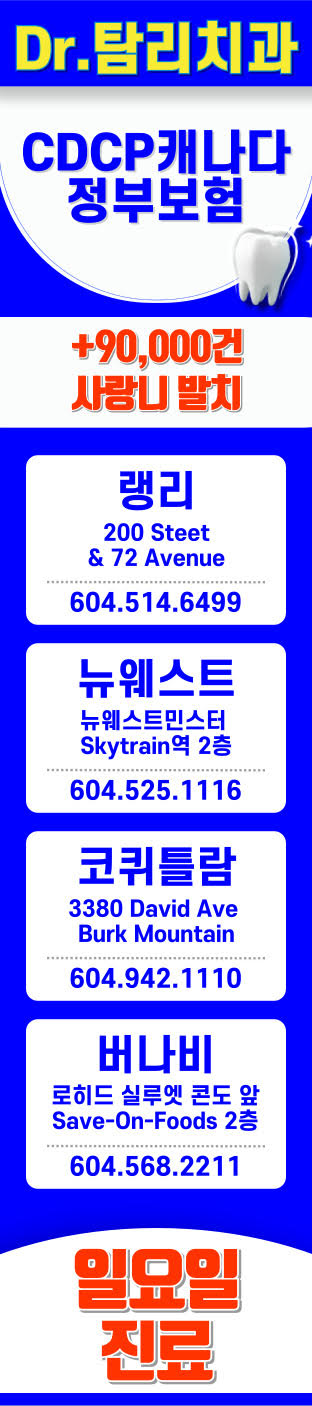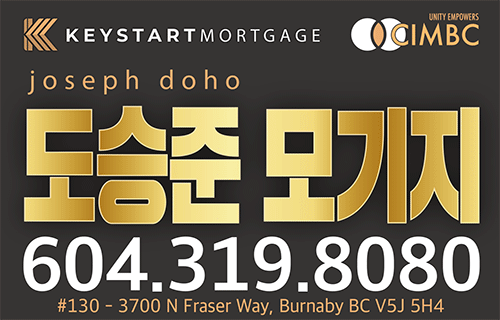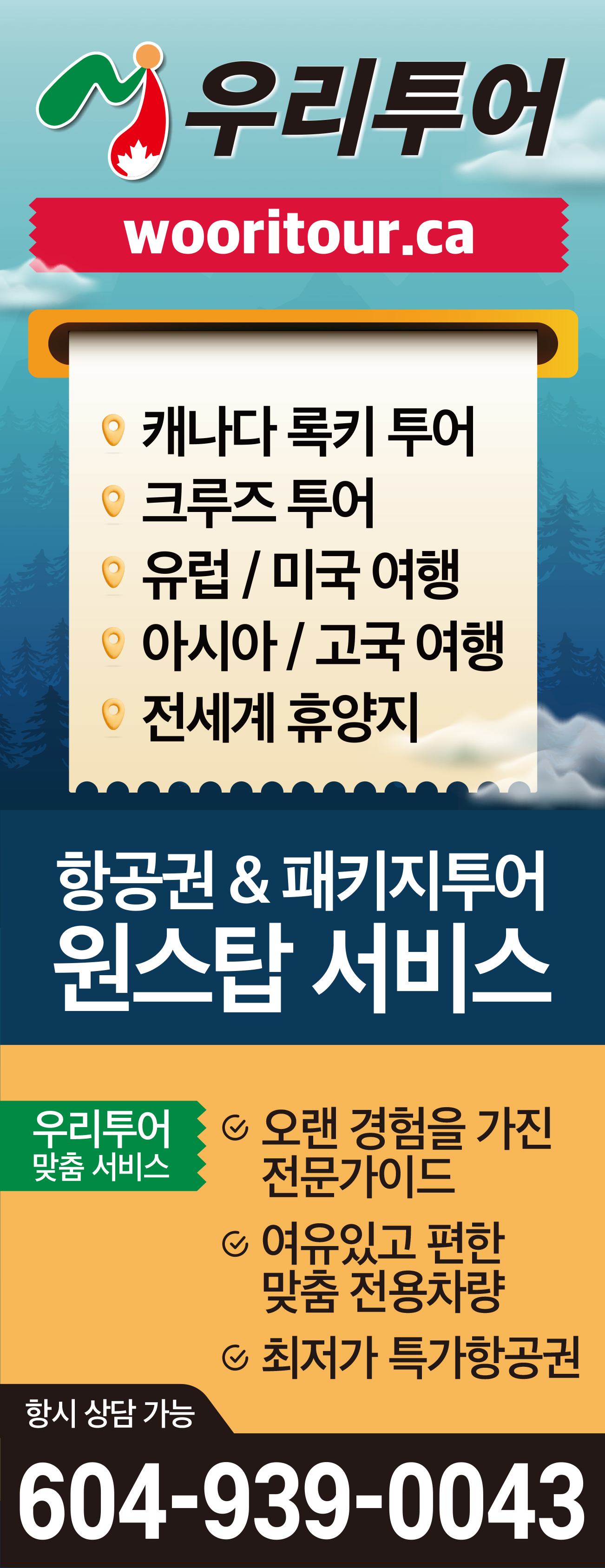최민자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반가부좌를 틀고 바다와 마주 앉으면 마음 안쪽에도 수평선이 그어진다. 수평 구도가 주는
안도감 덕분인가. 흐린 하늘에 부유하는 각다귀 떼 같은 상념들이 수면 아래 잠잠히
내려앉는다. 바다빛깔이 순간순간 바뀐다. 이 바닷가 어디쯤에 창 넓은 집 하나 지어 살고
싶다는 내 말에 섬에서 태어난 토박이 지인이 웃었다. 바다를 노상 보라볼 필요는
없어요. 생각날 때 고개를 넘어 달려가 안겨야 애인이지 같이 살면 마누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돛을 달고 왔다가 닻을 내리면 덫이 되어버리는 게 인생 아닌가.
한낮의 바다는 유순하다. 울부짖지도, 보채지도 않고 잡혀온 짐승처럼 가만가만
뒤친다. 저녁때가 되면 바다는 더 크게 뒤척이고 더 높이 기어오르려 안간힘을 쓸
것이다. 질척한 늪에 결박된 채 들숨 날숨으로 소일하고 있는 푸르고 거대한 대왕 해파리 한
마리. 바다란 태평양 한가운데에 말뚝이 박혀 있는 목줄 달린 짐승 같은 것이다. 헐떡거리고
씨근덕거리며 발정 난 짐승처럼 달려들어 보지만, 심술궂은 목부(牧夫)처럼 쥐락펴락
당겨가는 정체불명의 인력(引力)에 저항하지는 못한다.
‘그래, 여기, 여기까지만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한계야. 이렇게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뒤죽박죽 무너지고 말거야. 천 번의 입맞춤 끝에도 이별은 다반사가 되고
마는 걸……’
등등한 기세로 돌진해오다 거품만 물고 쿨렁거릴 뿐 끝내 뭍으로 기어오르지 못하는 파도
뒤에서 섬의 여신이 타이른다. 살점이 흩어지고 뼈마디가 그을린 채 숭숭 구멍 뚫린
발가락만 핥다가 천 번 만 번 돌아서는 바다를 지켜봐야 하는 여신의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쩌랴. 저 또한 붙박인 목숨인 걸. 존재의 절대거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위협이 되는, 그것이 이 행성의 운행법칙인 것을. 신은 바다를 방목하지
않는다. 아니, 아무 것도 방목하지 않는다. 바람이 끊임없이 바다의 살갗을 저민다. 살갗에
이는 거스러미에 잠시 핏빛이 어리기도 하지만 표피적 통증쯤이야 아무 것도
아니다. 벗어날 수 없는 운명, 허락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사정없이 제 몸을 짓찧고
쥐어박는, 물의 저 자학적 치기로 하여 바다는 사시사철 푸른 멍이 들어 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