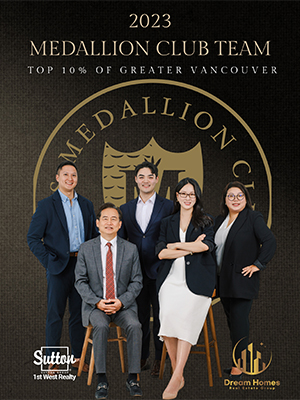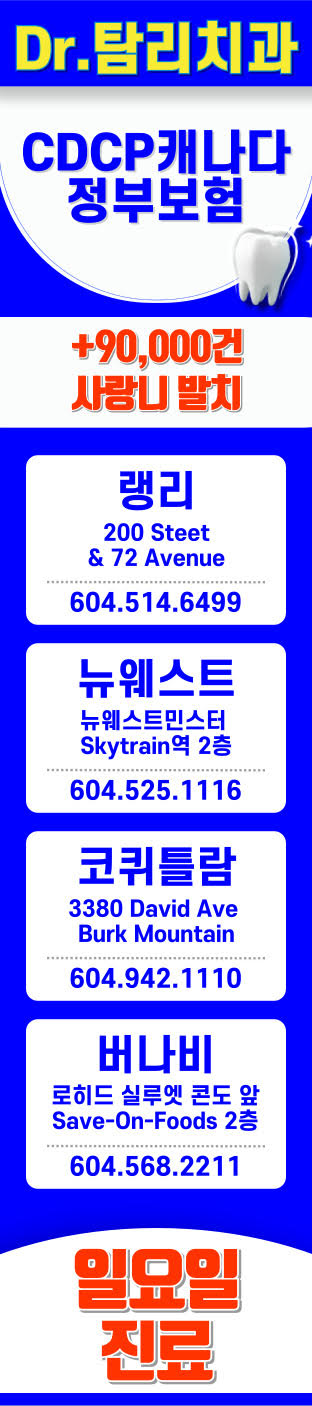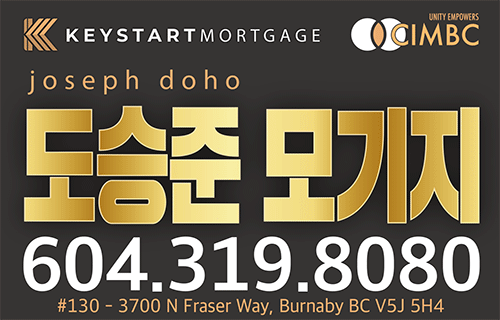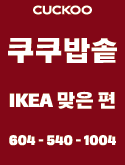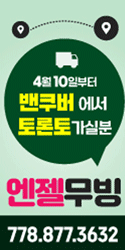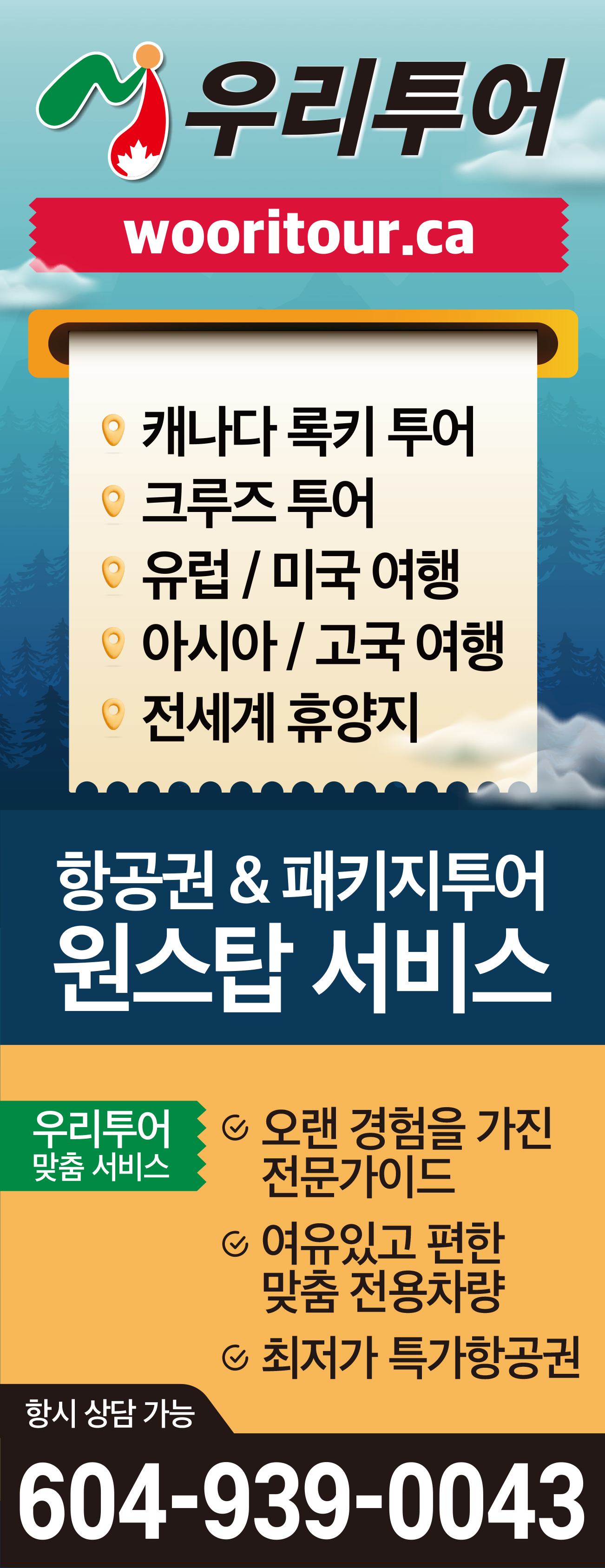권애영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툭하면 딜레이드(delayed) 아니면 캔슬드(canceled)라는 볼멘소리에 정 힘들면 돌아오라는 말이
돌아온다. 남편도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몇 주간 지속된 주제에 오늘은 유독 대화의 끝맺음이
유쾌하지 않다. 창문 넘어 분홍 벚꽃은 이미 파릇파릇한 이파리에 자리를 양보한 지 오래인데 창문
너머 멀리 설산은 그대로다. 잠시 감흥 없이 바라보다가 우울함에 무게가 있다면 더해진 듯 솜
뭉치 같아진 몸을 일으킨다.
도시락통을 펼치며 한국에선 전혀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며 통화에서도 했던 말을 혼자 되풀이해
본다. 짝꿍처럼 따라오는 “한국 같았으면….” 도 빼먹지 않는다.
한국에서 사고를 낼 뻔한 아찔한 경험으로 운전 트라우마가 있는 나는 거의 매일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아이의 학교는 집과 좀 떨어져 있다. 그리고 학교 근처엔 오로지 한 대의 버스만 다닌다.
불과 몇 달 전 까지만 해도 아이는 아파트 단지 내 학교에 다녔기에 혼자 등하교를 하였다. 그러나
다른 나라로 온 지 얼마 안 된 요즘에 나는 아이의 등학교를 도와야만 한다. 물론 이방인 처지라는
이유가 크지만, 이곳에서 내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다른 부모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캐나다에선
12세 이전에 아이는 어른과 함께 등 하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곳 에서의 등하교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인 셈이다. 그러기에 이 버스를 놓치면 안 된다. 만약 놓치면 지하철을 한
정거장 타고도 15분을 걸어야 한다. 아니면 택시를 탈 수도 있겠는데 버스를 놓친 긴박한 순간에
이곳에서 택시를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음 버스를 타고 지각하거나
지하철로 이동하고도 추가로 뜀박질해서라도 아이를 제시간 내에 학교에 집어넣는 것이다.
‘지각과 결석’이라니! -등교에서의 딜레이드 혹은 캔슬드인 셈인가?- 한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중의 하나였다. 관습 같은 것이다. 아이의 지각은 내가 회사에 늦는다는 것이고 이건
아무쪼록 아니 가급적을 넘어 절대에 가깝게 되도록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다. 그때 관성이
남은 탓일까. 정해진 시간에 오던 버스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초조함이 밀려온다. 구글 맵을
열어 확인해 본다. 불안한 예상이 맞아떨어지자, 짜증과 화가 솟구친다. 이게 벌써 몇 번째란
말인가. 화면 속 “캔슬드(canceled)” 글자만 확대되어 뇌리에 박힌다.
처음엔 학교에 바로 전화부터 했다. 수려하지 않은 영어로 지각 사유서를 구구절절 읊고 “아임
소리(I’m sorry)”를 내뱉았으나 돌아오는 답은 항상 “잇츠 오케이, 노 프라블럼(It’s OK. No
problem)”이었다. 이에 되레 더 죄책감이 일기도 해 더 이상 미리 반성문쓰기 전화는 하지 않는다.
오늘도 애써 외면한 채 교무실에 들러 아이 이름과 사유를 적고 나온다. 돌아서는 찰나 교실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그 끝에 걸음이 불편해 보이는 아동과 그 곁엔 보조 교사로
보이는 청년이 간격을 두고 행렬을 쫓는다. 그들은 그렇게 보통 아이들과 함께 야외 수업을 받는
걸까? 그 모습이 낯설어 잠시 내 시선을 붙든다.
그러나 이내 터벅터벅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버스가 취소된 여파는 돌아가는 차편에도
연쇄적으로 미친다. 이 십여 분 후, 내 뒤로 기다리는 이들이 한 무리가 될 즈음 도착한 만원
버스에 기어코 오르려는 데 운전사가 손짓으로 막는다. 더 이상 승객을 안 태우려는 건가?
한국인의 기백으로 기어코 이번 버스는 타야겠다 는 집념으로 운전기사에게 말을 걸라는 찰나,
버스는 트랜스포머가 된 듯 키를 낮추고 손을 내밀 듯 긴 판때기를 펼친다. 잠시 어리둥절한 사이,
버스 앞문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가 내려온다. “생큐, 드라이버!”를 외치며 유모차 주인은 유유히
내 곁을 지나간다. 그러는 사이 잠시 지난 시절이 떠올랐다. 내가 유모차를 끌고 버스 아니
대중교통을 이용한 적이 있던가? 그렇게 육아휴직 기간 내 반강제 자가 격리하며 지내온 세월이
스쳐 지나간다. 유독 한국 엄마들이 산후우울증을 심하게 겪는다면 그건 이런 갑갑함이 한 몫 했을
것이란 판단마저 빠르게 해치운다.
버스는 차곡차곡 사람을 채우고 비운다. 보조용 도구를 이용하는 이들은 어찌나 많은지, 여기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이고 지는 이들로 한가득 하다. 그런데도 내릴 곳에 미리 가서 서 있다든지
채비를 하는 사람조차 드물다. 또한 채근하는 사람 하나 없다. 캐나다야말로 진정한 만만디
사회다. 집에 언제 즈음 도착하려나. 이 물음에 답은 언제나 하세월이다. 속이 타는 걸 내색 하지
않으려 버스 안을 둘러본다.
내가 사는 지역의 특성이랄까? 버스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피부색은 물론이거니와 처음 들어
봄 직한 여러 언어가 뒤섞여 있다. 캐나다처럼 이민자가 많은 나라, 그리고 지리상 가까이 있기에
더 자주 비교가 되는 미국을 두고 흔히들 용광로의 나라라 부른다. 각국에서 온 이들이 미국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을 트랜스포머처럼 이곳에 맞게 변신해 어우러져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니라.
이와 달리 캐나다는 모자이크사회라 부른다. 내가 가진 특성을 굳이 변화하지 않고도 그저 퍼즐의
한 조각처럼 살아가는 나라라는 건데 과연 그러한가? 반문하는 사이 다음 정거장, 이번엔
휠체어를 탄 이가 버스에 오르자, 운전사가 승객을 향해 한마디 한다. 듣기 평가의 중요 부분을
놓쳐 혼란한 나 와는 달리 다른 승객들, 특히 앞자리에 앉아있던 이들은 벌떡 일어나 뒤로
이동한다.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포함하여 옆 좌석을 차례차례 접는다. 이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내게 다른 이가 조용히 뒤로 물러서 주기를 요청한다. 그렇게 휠체어는 퍼즐
조각 맞추듯 그 자리에 주차하려 하나 예상과 달리 힘들어하자, 운전사는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온다. 그 대열 맨 앞에 앉아있던 외국인은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자 운전사가 직접 일어나
주길 요청한다.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자 주변 한 사람이 나서서 통역하자 여유로운 주차 자리가
완성된다. 운전사는 직접 휠체어를 고정하고 재차 확인하고 나서야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아…. 그제야 왜 이리 지연과 취소가 잦았는지를 깨닫는다. 그리하여 캐나다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온전히 있는 그대로 여유로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카톡, 카톡”
남편의 번호가 찍힌 메시지가 내 손아귀에서 반짝인다. 반은 투정이었던 그동안의 대화에서
남편은 정답을 찾으려 하고 있겠지. 난 정답까진 아니어도 해답은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메시지
버튼을 두드린다. “잇츠 오케이, 노 프라블럼.”
따스한 햇살에 찌푸리면서도 설산을 보며 미소 짓는 내 얼굴이 창가에 드리운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권애영의 다른 기사
(더보기.)
권애영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